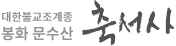좋아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일간지에도 써주시고
또 노랫말로도 소개된
‘풍경 달다.’란 시도 바로 운주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더 희미해질 부처님들
모습이시기에 미리 더 오래 보존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봅니다.
[정호승의 새벽편지]
내 인생의 스승 운주사 석불들
겨울 운주사(전남 화순군)를 다녀왔다.
새해에 내 인생의 스승을 찾아뵙고 엎드려 절을 올리고 싶어서였다.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을 올린다는 것은 진정 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연초에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선뜻 누구를 찾아뵙긴 어려웠다.
찾아뵙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셔서 그 대신 운주사 석불들을 찾아뵙고 절을 올렸다.
골목서 마주치는 이웃같은 얼굴
그동안 몇 번 운주사를 찾아갔지만 눈 내린 겨울 운주사를 찾은 건 처음이었다.
석불들은 찬바람에 말없이 눈을 감고 고요히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
어떤 석불은 눈이 채 녹지 않아 머리에 흰 고깔을 쓰고 있는 것 같았고, 칠성바위 위쪽에 계신 와불은 가슴께에 눈이 좀 남아 있어 마치 흰 누비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았다.
석불들은 내가 절을 올리자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꼭 껴안아주었다.
어릴 때 엄마 품에 안겼을 때처럼 아늑하고 포근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통과 상처로 얼어붙었던 내 가슴이 이내 따스해졌다.
다시 한 해를 살아갈 힘과 용기가 솟았다.
운주사에 가면 다들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나도 그렇다. 마치 부모형제를 찾아뵌 것 같다.
일주문을 지나자마자 오른쪽 석벽에 비스듬히 기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석불들을 보면 마치 오랫동안 집 떠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다정한 식구들 같다.
“왜 이제 오느냐, 그동안 어디 아프지는 않았느냐” 하고 저마다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
사가지고 간 만두나 찐빵이라도 내어놓으면 당장이라도 둘러앉아 다들 맛있게 웃으면서 먹을 듯하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같이 못생겨서 오히려 더 반가운 생각이 든다.
그들은 대부분 코가길고 이마 쪽으로 눈이 올라붙은 비대칭 얼굴인 데다 거의 다 뭉개졌다.
오랜 세월 만신창이가 된 탓인지 이목구비를 제대로 갖춘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평소 내가 참 못생겼다고 생각되는데 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싹 달아난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부처님을 뵙는다기보다 골목에서 마주친 이웃을 만난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정이 간다.
어떤 부처님은 너무 위압적이어서 공연히 주눅들 때가 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다.
경주 석굴암 대불이 당대의 영웅이나 권력자를 위한 석불이라면 이들은 민초들을 위한 석불이다.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는 그런 영웅적 존재가 아니라 운주사 석불 같은 평범한 존재다.
그들은 항상 겸손의 자세를 가르쳐준다.
가슴께로 다소곳이 올려놓은 그들의 손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손이다.
부처는 인간으로부터 기도의 대상이 되는 존재인데 그들은 오히려 인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사랑과 평화를 염원하는, 이 얼마나 이타적 삶의 겸손한 자세인가.
20년 전 삶의 방향을 알려줘
운주사 석불 중에 눈을 뜨고 있는 이를 찾긴 힘들다.
다들 눈을 감고 있다.
눈을 감고 양손을 무릎 아래로 손바닥이 보이게 내려놓고 있는 자세는 무엇 하나 소유하지 않고자 하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자세다.
눈을 감으면 비로소 남이 보인다.
내가 보인다 하더라도 남을 위한 존재인 내가 보인다.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 항상 눈을 뜨고 다녔다.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다 나를 위한 존재였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인 삶인가.
지난여름엔 매미가 너무 시끄럽게 운다고도 싫어하지 않았는가.
매미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인데 나는 매미만큼이라도 열심히 산 적이 있었던가.
20여 년 전 운주사를 처음 찾았을 때 와불을 찾아가는 산길 처마바위 밑에 있는 한 석불을 보고 나는 그만 숨이 딱 멎는 듯했다.
마모될 대로 마모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영원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버린 듯 고요히 앉아 있는 석불의 모습에 울컥 울음이 치솟았다.
고통의 절정에서도 고요와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석불의 모습에서 아마 내가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날 나는 오랫동안 그 석불 앞에 울며 서 있었다.
그러자 석불이 고요하고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울지 마라, 괜찮다, 나를 봐라.”
“…….”
“손은 빈손으로, 눈은 감고 영원을 향해, 그렇게 살아라.”
“네.”
나는 울먹이면서 속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이후 운주사 석불들은 초라한 내 인생의 스승이 돼 주었다.
그날 해질 무렵 천천히 눈을 밟으며 운주사를 막 떠날 때였다.
누가 석불 앞에 조그마한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눈에 띄었다.
만들어 놓은 지 며칠 됐는지 눈사람 또한 얼굴이 마모되고 형체도 일그러져 운주사 석불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문득 그 눈사람이 나 자신 같았다.
나는 그 눈사람을 가슴에 품고 서울로 돌아왔다.
올 한 해도 운주사 석불 같은 ‘눈사람 부처’를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아가리라 생각하면서.
정호승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