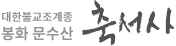고우 큰스님 순례 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영 작성일08-05-09 11:56 조회1,871회 댓글0건본문
그러고 보니 자꾸만 생각이 나는군요. 고우 큰스님을 백성호 기자님이 많이 취재 하셨더군요. 작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대담도 고우 큰스님과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 기사를 보고 너무 감동하였답니다. 금봉암의 장관과 큰스님의 깊은 뜻이 유감없이 펼쳐져 정말 불법의 큰 바다에 빠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하신 공부는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옆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 기억이란 참 재미난 것이군요.
“대혜스님, 선을 통해 시대정신 일깨워”
108명 순례단, 중국 간화선 발상지 방문
조계종은 ‘선종(禪宗)’이다. 주된 수행법은 ‘간화선(看話禪)’이다. ‘이뭣고’ ‘마삼근(麻三斤)’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등의 화두를 안고 참선에 든다. 그 화두가 깨질 때 ‘부처’를 만난다. 간화선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불교가 ‘중국화’한 참선법이다. 부처님 당시의 공부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간화선이 ‘부처님이 갔던 길과 다른 길’은 아니다. 다만 ‘나’를 여의고자 달려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래도 여읜 후의 자리는 부처와 둘이 아니다. 깨달음의 자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다.
10~13일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지식인 고우 스님(古愚·71·경북 봉화 금봉암 주지·전 각화사 태백선원장), 대강백인 무비 스님(無比·65·부산 범어사 승가대학장)과 함께 108명의 순례단이 중국의 간화선 선적지를 찾았다. 간화선 수행법을 창시한 송나라 때 대혜(大慧·1089~1163) 선사의 흔적과 고봉(高峰·1238~1295) 선사의 숨결을 만끽하기 위해서였다.
108명의 순례단은 만만한 이들이 아니었다. 고우 스님께 『금강경』을 배운 비구니 스님, 무비 스님께 『서장(書狀)』을 배운 재가불자, 또 직접 간화선을 수행하고 있는 생활인으로 구성됐다. 선적지를 찾을 때마다 이들의 가슴과 눈빛에서 흘러내리는 ‘간절함’은 남달랐다.
10일 중국 저장성(浙江省)닝보(寧波)공항에 내렸다. 남쪽이라 봄기운이 완연했다. 순례단은 아육왕사(阿育王寺)를 찾았다. 1700여 년 전에 세워진 고찰이다. 이곳에서 대혜 선사가 69세 때 주지를 지냈다. 무비 스님은 “그때 양식을 싸 가지고 와서 대혜 스님께 도를 묻는 사람이 1만2000명에 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혜선사는 북송 말 남송 초의 험난한 시대를 살았다. 요나라와 금나라의 침략으로 중화인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전란에 휩싸인 백성들은 유랑걸식으로 연명하던 때였다. 고우 스님은 “당시 대혜선사는 선(禪)의 진작을 통해 피폐한 시대정신을 일깨우려고 했다”며 “요즘 시대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긴 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삶의 목표와 가치를 잃고 정신적인 유랑걸식을 하고 있다. 선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아육왕사는 웅장했다. 아육왕사의 ‘아육왕’은 인도의 아쇼카왕이다. 그는 세상에 8만4000개의 부처님 사리탑을 짓겠다는 원을 세웠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2300년 전에 살았던 아쇼카왕이 1700년 전에 세워진 중국 사찰의 이름이 돼 있었다. 게다가 아육왕사에는 부처님 머리 부분의 진신사리도 모셔져 있다. 마침 아육왕사의 주지 스님이 순례단을 배려했다. 따로 보관하던 진신사리를 순례단이 볼 수 있게끔 들고 왔다.
순례단은 한 명씩 무릎을 꿇고 진신사리를 만났다. 황금색 종 안에 좁쌀만한 사리가 매달려 있었다. 중국인 주지 스님은 “어떤 이에겐 검정색, 어떤 이에겐 흰색, 또 어떤 이에겐 커피색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 앞에 앉았다. 부처님은 아무런 걸림도 없이 우주의 에너지와 하나가 됐던 이다. 그 엄청난 생명력의 파장이 피와 살, 골수 속으로 거침없이 흘렀던 이다. 그래서 눈을 감았다. 누구인가. 그러한 ‘걸림 없음’에서 동떨어진 ‘나’는 누구인가. 걸림 없음의 결정체인 부처의 사리와 ‘나’, 그 사이에 아득한 강물이 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리는 흔들림도 없었다. 저 하늘의 달처럼 그냥 있을 뿐이었다.
대혜선사가 창시한 ‘간화선’은 바로 이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아닐까. 눈에 보이는 콩알만한 사리가 아니라 온우주를 다 덮는 부처의 사리, 그 살아있는 숨결로 온전히 녹아들기 위한 길일 터다. 그래서 대혜선사의 선적지에서 만난 진신사리는 더더욱 중생을 돌아보게 했다.
아육왕사의 주법당 앞에 섰다. ‘묘승지전(妙勝之殿)’이란 편액이 눈길을 끌었다. 흔한 이름이 아니다. 풀면 ‘묘하게 드러난다(妙勝)’는 뜻이 된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묘유(묘하게 있음)’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다름 아닌 ‘부처의 지혜’를 일컫는다. 순례단은 그 편액 아래서 두 손을 모았다. 나의 화두가 타파되는 순간, 그 묘한 지혜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했다.
대혜 선사가 남긴 임종게(臨終偈)도 특이했다. 입적할 때 제자가 ‘임종게를 남겨달라’고 하자 대혜 선사는 이렇게 읊었다. “사는 것도 다만 이러하고(生也只任麻)/죽는 것도 다만 이러하네(死也只任麻)/게가 있고 없고(有偈與無偈)/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是甚麻熟大).” 죽음을 앞두고도 추호의 걸림이 없었던 그의 자리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11일 순례단은 항저우(抗洲)의 천목산으로 갔다. 중국 5대 불산(佛山) 중 하나다. 옛날에는 계곡마다, 봉우리마다 불상과 암자가 빼곡하게 박혀있던 산이다. 중·일 전쟁으로 인해 상당수가 파괴돼 있었다. 그래도 이곳에 고봉 선사의 피와 땀, 그리고 깨달음이 깃들어 있었다. 1500m 고지에 고봉선사가 머물던 선원 ‘개산노전(開山老殿)’이 있었다. 거길 향한 돌계단은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중국인들은 그 길을 ‘천년고도(千年古道)’라고 불렀다.
그 계단을 따라 고봉 선사가 남긴 구도의 여정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다. 까마득한 절벽이 바로 코 앞에 내려다보이는 ‘사관’에서 고봉 선사는 15년간 수행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서 열반했다. 캄캄한 바위굴, 중생의 눈에는 분명 막힌 곳이다. 그러나 깨달은 이에겐 거기가 무한한 우주의 중심이 된다. 나를 막는 이, 나를 가두는 이. 그 또한 ‘나’다.
글=항저우·사진=백성호 기자
◇『서장』과 『선요』= 대혜 선사와 고봉 선사는 간화선 수행에 있어 ‘양대 봉우리’다. 대혜 선사의 『서장』과 고봉 선사의 『선요』는 간화선 수행자에게 ‘교과서’로 꼽힌다. “간화선 수행은 이럴 때 이렇게 하라”며 당시 사대부들에게 보낸 편지글을 모은 대혜 선사의 『서장』에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선사의 자상함이, 또 법상(法床·설법하는 중이 올라앉는 상)에서 내린 간화선 수행 법문을 묶은 고봉 선사의 『선요』에는 군더더기 없는 직관과 간결함이 담겨 있다. 현실 참여를 내세웠던 대혜 선사와 깊은 산중에 은둔하며 철저하게 수행자의 길을 간 고봉 선사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사실 저는 그때 그 기사를 보고 너무 감동하였답니다. 금봉암의 장관과 큰스님의 깊은 뜻이 유감없이 펼쳐져 정말 불법의 큰 바다에 빠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하신 공부는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옆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 기억이란 참 재미난 것이군요.
“대혜스님, 선을 통해 시대정신 일깨워”
108명 순례단, 중국 간화선 발상지 방문
조계종은 ‘선종(禪宗)’이다. 주된 수행법은 ‘간화선(看話禪)’이다. ‘이뭣고’ ‘마삼근(麻三斤)’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등의 화두를 안고 참선에 든다. 그 화두가 깨질 때 ‘부처’를 만난다. 간화선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불교가 ‘중국화’한 참선법이다. 부처님 당시의 공부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간화선이 ‘부처님이 갔던 길과 다른 길’은 아니다. 다만 ‘나’를 여의고자 달려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래도 여읜 후의 자리는 부처와 둘이 아니다. 깨달음의 자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다.
10~13일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지식인 고우 스님(古愚·71·경북 봉화 금봉암 주지·전 각화사 태백선원장), 대강백인 무비 스님(無比·65·부산 범어사 승가대학장)과 함께 108명의 순례단이 중국의 간화선 선적지를 찾았다. 간화선 수행법을 창시한 송나라 때 대혜(大慧·1089~1163) 선사의 흔적과 고봉(高峰·1238~1295) 선사의 숨결을 만끽하기 위해서였다.
108명의 순례단은 만만한 이들이 아니었다. 고우 스님께 『금강경』을 배운 비구니 스님, 무비 스님께 『서장(書狀)』을 배운 재가불자, 또 직접 간화선을 수행하고 있는 생활인으로 구성됐다. 선적지를 찾을 때마다 이들의 가슴과 눈빛에서 흘러내리는 ‘간절함’은 남달랐다.
10일 중국 저장성(浙江省)닝보(寧波)공항에 내렸다. 남쪽이라 봄기운이 완연했다. 순례단은 아육왕사(阿育王寺)를 찾았다. 1700여 년 전에 세워진 고찰이다. 이곳에서 대혜 선사가 69세 때 주지를 지냈다. 무비 스님은 “그때 양식을 싸 가지고 와서 대혜 스님께 도를 묻는 사람이 1만2000명에 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혜선사는 북송 말 남송 초의 험난한 시대를 살았다. 요나라와 금나라의 침략으로 중화인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전란에 휩싸인 백성들은 유랑걸식으로 연명하던 때였다. 고우 스님은 “당시 대혜선사는 선(禪)의 진작을 통해 피폐한 시대정신을 일깨우려고 했다”며 “요즘 시대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긴 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삶의 목표와 가치를 잃고 정신적인 유랑걸식을 하고 있다. 선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아육왕사는 웅장했다. 아육왕사의 ‘아육왕’은 인도의 아쇼카왕이다. 그는 세상에 8만4000개의 부처님 사리탑을 짓겠다는 원을 세웠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2300년 전에 살았던 아쇼카왕이 1700년 전에 세워진 중국 사찰의 이름이 돼 있었다. 게다가 아육왕사에는 부처님 머리 부분의 진신사리도 모셔져 있다. 마침 아육왕사의 주지 스님이 순례단을 배려했다. 따로 보관하던 진신사리를 순례단이 볼 수 있게끔 들고 왔다.
순례단은 한 명씩 무릎을 꿇고 진신사리를 만났다. 황금색 종 안에 좁쌀만한 사리가 매달려 있었다. 중국인 주지 스님은 “어떤 이에겐 검정색, 어떤 이에겐 흰색, 또 어떤 이에겐 커피색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 앞에 앉았다. 부처님은 아무런 걸림도 없이 우주의 에너지와 하나가 됐던 이다. 그 엄청난 생명력의 파장이 피와 살, 골수 속으로 거침없이 흘렀던 이다. 그래서 눈을 감았다. 누구인가. 그러한 ‘걸림 없음’에서 동떨어진 ‘나’는 누구인가. 걸림 없음의 결정체인 부처의 사리와 ‘나’, 그 사이에 아득한 강물이 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리는 흔들림도 없었다. 저 하늘의 달처럼 그냥 있을 뿐이었다.
대혜선사가 창시한 ‘간화선’은 바로 이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아닐까. 눈에 보이는 콩알만한 사리가 아니라 온우주를 다 덮는 부처의 사리, 그 살아있는 숨결로 온전히 녹아들기 위한 길일 터다. 그래서 대혜선사의 선적지에서 만난 진신사리는 더더욱 중생을 돌아보게 했다.
아육왕사의 주법당 앞에 섰다. ‘묘승지전(妙勝之殿)’이란 편액이 눈길을 끌었다. 흔한 이름이 아니다. 풀면 ‘묘하게 드러난다(妙勝)’는 뜻이 된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묘유(묘하게 있음)’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다름 아닌 ‘부처의 지혜’를 일컫는다. 순례단은 그 편액 아래서 두 손을 모았다. 나의 화두가 타파되는 순간, 그 묘한 지혜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했다.
대혜 선사가 남긴 임종게(臨終偈)도 특이했다. 입적할 때 제자가 ‘임종게를 남겨달라’고 하자 대혜 선사는 이렇게 읊었다. “사는 것도 다만 이러하고(生也只任麻)/죽는 것도 다만 이러하네(死也只任麻)/게가 있고 없고(有偈與無偈)/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是甚麻熟大).” 죽음을 앞두고도 추호의 걸림이 없었던 그의 자리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11일 순례단은 항저우(抗洲)의 천목산으로 갔다. 중국 5대 불산(佛山) 중 하나다. 옛날에는 계곡마다, 봉우리마다 불상과 암자가 빼곡하게 박혀있던 산이다. 중·일 전쟁으로 인해 상당수가 파괴돼 있었다. 그래도 이곳에 고봉 선사의 피와 땀, 그리고 깨달음이 깃들어 있었다. 1500m 고지에 고봉선사가 머물던 선원 ‘개산노전(開山老殿)’이 있었다. 거길 향한 돌계단은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중국인들은 그 길을 ‘천년고도(千年古道)’라고 불렀다.
그 계단을 따라 고봉 선사가 남긴 구도의 여정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다. 까마득한 절벽이 바로 코 앞에 내려다보이는 ‘사관’에서 고봉 선사는 15년간 수행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서 열반했다. 캄캄한 바위굴, 중생의 눈에는 분명 막힌 곳이다. 그러나 깨달은 이에겐 거기가 무한한 우주의 중심이 된다. 나를 막는 이, 나를 가두는 이. 그 또한 ‘나’다.
글=항저우·사진=백성호 기자
◇『서장』과 『선요』= 대혜 선사와 고봉 선사는 간화선 수행에 있어 ‘양대 봉우리’다. 대혜 선사의 『서장』과 고봉 선사의 『선요』는 간화선 수행자에게 ‘교과서’로 꼽힌다. “간화선 수행은 이럴 때 이렇게 하라”며 당시 사대부들에게 보낸 편지글을 모은 대혜 선사의 『서장』에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선사의 자상함이, 또 법상(法床·설법하는 중이 올라앉는 상)에서 내린 간화선 수행 법문을 묶은 고봉 선사의 『선요』에는 군더더기 없는 직관과 간결함이 담겨 있다. 현실 참여를 내세웠던 대혜 선사와 깊은 산중에 은둔하며 철저하게 수행자의 길을 간 고봉 선사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