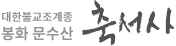원(願)으로 살아가는 당신은 보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축서사 작성일10-06-06 12:32 조회2,827회 댓글0건본문
원(願)으로 살아가는 당신은 보살!
이 미 령_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자칫 허무에 빠지기 쉬운 우리
늦은 시각 저녁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차안에서 칼칼하고 따끔따끔한 목에 억지로 침을 넘기면서 나의 하루를 돌아볼 때면 따뜻한 보람보다는 서걱서걱한 외로움과 허전함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정신 차려! 모든 것은 자기성품이 비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사이 잊은 거야? 너는 숱한 사람들에게 그런 강의를 하면서 왜 정작 네 자신과 마주할 때는 ‘공(空)’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지?”
공(空)-.
‘빈 것’이라는 말-.
나는 강의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도 비워내고, 수강생들의 만족스런 표정과 우레 같은 박수를 기대하려는 생각도 비워내고, 아니 더 나아가 강사 ‘이미령’이라는 생각조차도 비워내고, 내 앞에 앉은 백 명이 넘는 수강생들을 바라보면서도 ‘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생각조차도 비워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만, 중년의 저녁에 접어든 이 나이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헛헛하고 칼칼한 외로움만 가득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워낙 깊고 다양해서 딱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기 성품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버려야 해’라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한다는 ‘공’의 가르침이 하나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의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금강경을 읽고 반야경을 읽고 참선을 하면서 공하다는 생각조차도 비워내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성품이 비었다’는 공의 이치를 체득하고 실천한다는 것이 대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공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공’의 이치만을 강조하다보면 숱한 사람들은 나침반도 이정표도 사라진 광대한 사막에 버려진 느낌이 들기까지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텅 빈 충만이 아름다운 이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아도 ‘공(空)’은 ‘공’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어야 옳겠 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인간이란 생명체는 비우고 부정하고 잘라내는 거부와 반항의 몸짓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느낍니다. 채우고 긍정하고 끌어안는 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는 힘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의 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은 들판에 아름답게 피어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서 굳이 장미니 진달래니 하는 이름으로 구별되어 불릴 필요도 없고, ‘꽃’이라는 작명(作名)조차도 무의미할 정도로 본래부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자체’만으로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법정스님의 책 제목인가요? ‘텅 빈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어쩌면 기를 쓰고 채우고 채우려다 끝내 채우지 못하고 그러고도 미련이 남아 원망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텅 빈’이라는 말이 그리도 아름답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일 ‘텅 비다’라는 말뿐이었다면 우리가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충만’이라는, ‘가득 채움’이라는, 그 절대긍정의 단어가 따라붙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제목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우고 또 비워서 도달하는 그곳이 있기에 우리는 처절하게 버리고 비우는 수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바람이 없다면 아무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자기성품이 비었다고 보는 공의 지혜를 완벽하게 체득하려는 바람을 품고 실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보살은 ‘공’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빈 것’으로 뭘 어쩌겠습니까? 자기성품이 비었다고 관찰하는 그것마저도 빈 것이라는데, 이런 ‘공’의 이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살면서, 펄떡펄떡 뛰는 맥박으로 하루를 버티고 한 달을 살아내고 일 년을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원(願)으로 살아가는 종교인
사람을 살게 해주는 것은 원(願)입니다. 수행자도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이러한 일을 이루겠다, 내가 기도를 원만하게 마쳐서 저러한 바람을 이루겠다, 나의 수행이 이웃에게, 중생계에게 이러저러한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원으로 살아가는 수행자가 보살입니다.
원(願)이 없는 행위는 무의미한 몸짓일 뿐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더욱 그러합니다. 바람이 간절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자칫 무뎌지거나 무너지기 쉽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성현이 목숨과 맞바꾸며 터득하고 일러준 그 생명의 말씀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사들인 물건을 유행이 지나고 싫증이 나면 폐기처분하거나 집안 어딘가에 버려두고서 자신에게 그런 물건이 있는지 기억조차 가물해지듯,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화엄경에는 보살의 수행은 열 단계(十地)가 있다고 일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환희지(歡喜地)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경지입니다.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커다란 기쁨이 샘솟는 경지입니다. 하지만 이 경지를 맛보면 이내 크나큰 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환희지는 ‘기쁨’보다 ‘원’을 더 강조합니다. 기쁘기만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 기쁨을 알뜰하게 굴려서 완전하고 흠이 없으며 누구나 흡족한 그런 기쁨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보살은 ‘원’을 품습니다. 지옥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지장보살은 대원본존(大願本尊)이라 불리고, 법장비구의 48원은 극락세계를 건설하였고, 선재동자의 구도행은 보현보살의 십대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네 가지 소망을 품습니다. 사홍서원이 그것입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자신의 ‘원’을 점검해볼 일입니다. 소망이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바람이 물렁해지지 않았는지, 서원이 흐릿해지지 않았는지…. 원(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보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