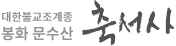엄마가 꽃들 속에서 웃으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축서사 작성일08-11-03 13:33 조회2,664회 댓글0건본문
이미현_서울
길가의 사루비아들이 참 섧게도 붉다. 매년 이맘때면 난 이십여년 전 추석을 막 보낸 어느 가을 날 채송화, 들국화, 과꽃, 사루비아들로 소복했던 작은 화단을 떠올리곤 한다. 엄마가 지수화풍 사대로 돌아가던 그 시각, 하얀 소복을 입고 화장장 화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기진한 몸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꽃밭은 애잔하면서도 화사했다. 차마 못다 피우고 삶을 마감한 나의 엄마처럼.
삼우제를 지내고 남동생과 함께 발길 닿는 대로 대구에서 가까운 해인사로 향했다. 홍제암에 이르니 마침 저녁예불 시간. 장례 내내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아 큰아버지로부터 ‘독하다’는 말까지 들었었는데 아미타불 정근을 하다가 때늦은 오열이 터져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한참 후에 기도스님이 조용히 내 좌복 옆에 금강경 책을 놓으셨다. 스님과 함께 금강경을 읽어내려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졌다. 새벽예불 때마다 가슴에 사무치는 구절 ‘산문숙정절비우(山門肅靜節悲優)’가 이때만큼 절실했으랴….
가까운 이의 생명이 스러지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고통이다. 엄마가 도저히 치유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한달여간 강원도 낙산사에서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드렸다. 밤마다 혼자 해수관음보살님 앞에 꿇어 앉아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꼭 낫게 해달라고 빌지는 못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나와 우리 가족의 업이 그러하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도록,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덜 상처받도록 부처님 가피가 주어지기를 빌었다. 하염없이 부딪치는 바다파도 소리가 내 기도에 대한 답이었다.
그 와중에 불교를 다시 생각했다. 대학 일학년 때 만난 현암사의 불교책들은 적잖은 충격이었다. 어린 날부터 고민해왔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불교에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무망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삶에서 불교만이 탈출구로 보였다. 하지만 자신이 불자라고 불리우는 것이 멋쩍어 꽤 오래 절집 밖으로만 돌았다. 그랬기에 어쩌다가 절에 가서 제사나 영가 같은 단어들을 들을 때마다 무척이나 비불교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후 아버지마저 유명을 달리 하시어 절에서 49재와 천도재를 모시긴 했으나 제사나 천도에 대한 나의 선입견은 그닥 달라지지 않았다. 돌아가신 분께는 천도 이상의 효행이 없다고들 하고, 법문 가운데서도 영가법문이 고준하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그저 귓전으로 흘렸었다.
그러다가 시절인연이 되었는지 지난 백중에 큰스님을 뵈었을 때 엄마를 이 도량에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 드디어 제사 전날 올라간 축서사. 마당 곳곳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들이 나를 보고 활짝 웃어주었다. 더 이상 가을꽃 보는 일이 쓸쓸하지 않으리….
도량의 한가운데 모셔진 보탑을 마주보며 제사가 시작되었다. 성전에서 마주보이는 큰법당에서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제사 내내 큰스님과 대중들이 함께 영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심도 느꼈다.
기도스님께서 ‘행효자… ’를 부르실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웠으니…. 불설아미타경을 읽고 무상계를 읽어내려갔다. 오래전 어느 노거사님이 나를 보자마자 “보살은 무상계를 매일 읽어야겠네.”라고 하셔서 속으로 뜨끔했던 일이 있었는데 아무러나 나는 무상계가 좋다. 이 날도 엄마에게 진심을 다해 들려드렸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영가여, 이제 오온의 빈 주머니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마음자리 뚜렷이 나타나 부처님의 거룩한 계를 받았으니 어찌 통쾌하지 않으며 통쾌하지 않으랴. 천당(天堂)과 불찰(佛刹)에 마음대로 왕생하니 참으로 통쾌한 일이로다. ’라는 대목에서는 나도 모르게 벙긋 웃음이 벌어졌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다가 또 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시원해져서 웃다가…. 그렇게 제사를 마치니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몸의 무게를 느낄 수 없었다.
‘천도재는 돌아가신 사람을 제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자기 천도의 기회로 삼아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큰스님 말씀처럼 제사를 지내고 나니 마음의 안락이 컸다. 부처님과 큰스님의 자비가 드리워져 있는 선 도량에 엄마를 모셨다고 생각하니 말 그대로 안심안심이다.
이렇게 올 가을 나는 축서사에서 여느 해보다 행복한 어머니 제사를 모셨다. 모처럼 엄마와 오붓하게 아름다운 도량을 거닌 기분이다. 생전에 절이라곤 걸음도 안하셨던 분이 돌아가실 무렵 ‘다시 살아나면 너하고 같이 절에 다니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엄마…. 돌아가신 후 관 속에 염주를 넣어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에서야 엄마의 소망을 들어드린 것 같아 기쁘다. 제사를 마친 후 위패를 들고 소대로 향하는데 키작은 코스모스들 사이에서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