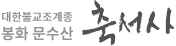떠나는 자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축서사 작성일08-05-21 17:14 조회2,789회 댓글0건본문
떠나는 자유

현태 지휘 선사는 함태에서 출생했다. 속성은 고씨였다. 유년시절부터 절에 다니기를 좋아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끝내 규봉(圭峰)에게 득도했고 본인(本仁) 화상을 찾아가 의심난 것을 참문했다.
이때 일대사 인연을 깨달아 마쳤고 불조의 심인(心印)을 깨달아 다시는 부처와 조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낙경으로 자리를 옮겨 중탄에 자리를 잡고 온실원(溫室院)을 창건했다. 이때부터 그는 중생의 병을 걱정하여 항상 약을 만들어 아픈 사람이 있을 때마다 주었다. 약을 먹은 사람들은 특별한 효험이 일어나 병이 완치되었다.
이때 스님 한 분이 나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는데 대중들은 그와 함께 있기를 꺼려하고 싫어했다. 나병에 걸린 스님은 대중과 격리되어 방 한 칸을 얻어 정진했다.
지휘 선사는 나병에 걸린 스님을 자신의 방으로 오도록 하여 같이 있자고 했다. 모든 대중이 싫어하는 사람과 그는 같이 있으면서 아픔을 같이 하고 싶었다. 지휘선사의 간청이 너무 간절하여 끝내 거절치 못하고 한 방에서 지냈다. 지휘선사는 날마다 나병에 걸려 있는 비구의 몸을 씻어 주고 자신이 직접 만든 약을 먹도록 했다. 나병에 걸려 있는 수행자는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고름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휘선사는 조금도 더럽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날마다 그 몸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지극한 자비로 한 몸이 되어 오직 비원(悲願)만 있었다. 이 간절한 비원 앞에 어느 누구의 고통인들 녹아내리지 않겠는가. 지휘선사의 지극한 간호에 의해 그의 몸에서 이상한 효험이 일기 시작했다. 악취가 만연하던 몸에서 향기가 나고 고름이 흐르던 손가락에서 고름이 멈추고 새살이 돋아났다. 새로이 건강이 회복되고 있었다.
대중들은 그가 나병 환자임을 알고 같이 밥 먹는 것조차 기피했는데 그가 조실스님 방에서 거처하고 있는 것이 몹시 불만스러웠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병환자가 옆방에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음식을 토해버리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휘선사만은 나병환자와 한 몸이 되어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그를 극진히 간병했다.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수행자는 어느 날 지휘선사가 잠든 사이 그의 곁을 떠나버렸다. 그가 남긴 것은 고름이 말라 딱지가 되어 떨어진 것뿐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딱지에서 악취가 나지 않고 향기가 그득했다. 나병환자가 남긴 고름 딱지는 너무 많았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것과 같았다. 지휘선사는 이 신기한 일에 골몰하다가 그 딱지를 모아 관음상을 조성하여 모셨다. 더욱 신기한 것은 관음상에서 배어나온 향기가 방안에 가득했다.
지휘선사는 양(梁)의 개평(開平) 5년(911)에 온실원에서 미련 없이 떠나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홀로 간직하고 지키던 외로움과 신령스러움이 빛을 잃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집착이 생긴다. 집착은 반드시 얽매임을 만든다. 종남의 옛 터로 돌아온 그는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는 어느 날 암자 뒤에 있는 바위 주위를 거닐다가 사람이 머물다 간 자취를 발견했다. 누더기, 염주, 삿갓 등이 흩어져 있었다.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자 썩어서 부스러져 버렸다.
이때 지휘선사는 시자에게 말했다.
“이것은 내가 전생에 쓰던 도구이다. 여기에다 절을 지어 옛 인연을 일으키고 싶다.”
시은을 모아 절을 짓고 산 이름을 중운(重雲)이라 했다. 그는 절을 지은 다음 평소 친하게 지낸 그 고을 왕공(王公)을 찾아가 하직인사를 하고 돌아와 정진만을 계속했다. 이때 당의 명정이 편액을 하사했고 제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의 지혜와 덕화 앞에 대중이 모여든 것이다.
이때 제자 한 사람이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근원에 돌아가서 뜻을 얻는 것입니까?”
“벌써 잊어버렸구나.”
“뜻밖에 티끌이 생길 때 어떤 것이 이 몸이 나아갈 외길입니까?”
“발밑에 이미 풀이 났는데 만 길의 구렁텅이 있느니라.”
“요긴한 길이 평탄하면 어떻게 밟으리까?”
“내가 만약 그대에게 가르쳐 주면 동서남북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 무더기 진흙이니라.”
스님은 다시 자리를 옮겨 절을 지었다. 대중이 천오백 명을 넘었다. 그의 덕화가 얼마나 깊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때 영흥 절도사 왕언초가 일찍부터 스님의 신도가 되어 출가하기를 청원했으나 그때마다 스님은 “그대는 훗날 출세하리라. 그때를 기다려 불교를 외호하라.”하시면서 만류했다.
지휘선사는 스스로 자신의 육신 속에 저녁노을이 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임종게를 써 내려갔다.
나에게 집 한 채가 있는데 부모가 지붕을 보수하여 덮어주었다
팔십년 동안 왕래하노니 요사이는 서서히 훼손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진즉부터 딴 곳으로 옮겨가려 했으나 당하는 일마다 애증이 있었다. 그가 무너질 때가 되면 그와 나는 서로 걸림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임종게를 남기고 가부좌를 틀고 입적했다. 집 한 채가 끝내 낡아서 망가져 참으로 멀리 주인은 떠나고 없었다. 그래서 공적(空寂)한 것인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