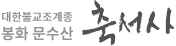새로운 출발로의 정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윤희 (월간 맑은소리 맑은… 작성일05-12-28 20:20 조회5,774회 댓글0건본문
작년 늦가을, 난 9개월쯤 된 나의 아기를 안고 스님의 영정 앞에 섰다. “스님, 진작 찾아오지 못해 죄송해요. 스님의 원고를 정리도 해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스님을 보내드려야 하나 봅니다.” 불교를 접하고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된 ‘공부’. 그 공부를 주신 스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호명 스님이시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승찬대사의 신심명은 참 간결하고도 마음 와닿는 좋은 교재였다.
바쁜 일정 중에도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찾아갔던 시탑전(통도사 노스님들의 처소)의 스님 방은 나이를 초월한 도반들로 가득했다. 30~40여 명에 달하는 도반들은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직업도 제각각이었다. 모두 어렴풋하게나마 공의 원리, 또 그런 이치를 깨닫기에 여념이 없던 시간이었다. 청강생들은 마치 다단계 사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늘었고 스님의 웃음은 팔십 노구를 잊은 채 높기만 했다. 그런 증가세를 탄 분위기 속에서도 스님은 언제나 ‘숙이고 살라’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셨다. 그것이 또 스님의 생활관이기도 했다.
스님은 아무리 나이가 적은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낮추는 법이 없으셨으며 고개 숙인 승려의 형상을 볼펜으로 쓱쓱 그려 돌아가는 손님들의 손에 들려주곤 했다. 불교의 이면에 대해 충고하곤 했던 스님은 그 때문에 사중(寺中)의 법사스님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곤 했다. 그러면서도 도심 불자들을 제접할 선방 하나를 꾸리려는 원(願)을 놓지 않으셨던 스님은 적당한 위치에 선방자리를 눈여겨 봐서 일러달라는 말씀과 수행이야기를 좀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줄곧 당부하시곤 했다. “네, 스님.” 난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스님을 영영 뵙지 못했다. 그 후 아직 1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스님의 첫 기일이면 뭔가 스님 앞에서 드릴 말씀이 있어야 했다. 아직도 어린 아가를 데리고 출퇴근을 하는 나는 매일이 치열한 정진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분이 있어 나를 자꾸만 그쪽으로 이끄는 것을 발견했다. 떨어지려 하지 않는 아가를 두고 난 과감하게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뭐 거창하게 공부를 시작했다는 말이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맘속의 원을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렇게 찾아 간 스님, 이분 역시 주류는 아니었다. 이를테면 제도권 안의 스님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불교의 계율을 타파했다거나 무시하는 스님이 아니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삼는 분으로서 이미 불교계에 파란을 일으킨 책을 펴낸 이력의 소유자이다.
스님의 가르침은 게으른 내 공부에 다시 불을 지펴주셨다. 금요일 저녁이면 넓지 않은 법당 한 쪽에 앉아 대승기신론에 빠져 있는 몇몇의 수강생들의 대열에 나도 같이하고 있다. 그간 어렴풋하게 알았던 불자로서의 삶이 정말 축복임을 절절하게 느끼며 두 시간여의 공부에 빠진다. 무명을 일깨우는 일, 그 어리석음을 벗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기신론의 원본은 내 새로운 공부에 있어 맘에 쏙 드는 교재이기도 하다. 흑판에 분필가루를 날려가며 강의에 여념이 없는 스님의 열정도 대단하여 공부에 만족을 더해준다.
이제 1권을 떼었지만 사실 1권을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와 강의에 열중해야 겨우 부처님의 생을 원효 스님의 글을 통해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피상적인 공부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공부가 필요한 까닭이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성불에 있다고 스님은 가르쳐 주었다. 그 성불의 길은 구도의 길을 떠난 부처님의 생을 바로 아는 일이며 다름 아닌 ‘나’를 바로 아는 일임을 안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위해 할애할 수 있다면 더없이 고마울 일이 없을 것 같다.
“노스님, 고맙습니다. 제게 공부의 길을 열어 주셔서요.”
“스님,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바른 가르침 이렇듯 다시 받게 해 주심에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