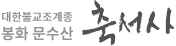그 날은 호주의 겨울이
막 시작되는 6월 초순쯤이었다. 이른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 왔다.
린드씨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이제 육십을 조금 넘긴
린드씨는 30대 초반에 핀란드에서 호주로 이민 온 사람이었다. 그가
호주에 오기 전 핀란드에서 무엇을 했고, 또 지난 30년 동안 호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독신이며 그 당시 우리가 세놓고 있던 작은 건물의 한 세입자라는
사실뿐이었다.

시드니에서 학교다니던
큰 아이도 그 건물에 살고 있었으므로 한번씩 가보면 린드씨는 앞마당
작은 화단에서 나무나 꽃을 돌보고 있곤 했다. 서로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저 “안녕하세요. 꽃이 예쁘군요.” 아니면 “날씨가 좋군요.”하는
의례적인 인사를 던진다.
그러면 그는 몹시 수줍게
받으면서도 마주 보고는 얘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분이셨다. 가끔
시드니에서 밤늦게 일이 끝나는 날이면 그곳에서 자고 새벽이면 금붕어들이
기다리는 와이용 농장으로 달려오곤 하는데 그럴 때 어스름한 새벽에
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에 나오면 린드씨의 아파트 현관문 밑으로 항상
불빛이 새어 나왔다. 큰 아이 얘기가 그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쯤
공장 일을 나가기 전까지 책을 읽는다고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직장을 잃었고 이웃의 눈에 띌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침내 그가 아파트 건물 한 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아래층
이웃이 앰뷸런스를 불렀고 그는 그렇게 병원에 실려 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때 병원에서 보호자를
찾았건만 그는 가족도, 친척도 더구나 친구도 없다고 했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사람도 없냐고 하니까 가끔 들르는 건물주를 알고 있다고 지목했으므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아는 사람으로서 병원측의 연락으로 그를 면회하러
갔다.
병원에서 본 그에게
핀란드의 가족 얘기를 물어 보았으나 아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불안해했고 담배와 술을 먹고 싶어했다. 담당의에게서 그가 알콜중독자이며
좀더 다른 검사를 해 봐야겠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 아무려면 설마
그에게 누군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를 금방 잊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 그렇게 그의 갑작스런 죽음을 통고받게 된 것이다.
병원에서는 연고가
없는 린드씨를 해당지역의 사회복지부로 보고했고, 그곳에선 우리가
그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첨부서류에 따라서 다시 연락이
왔다. 내용인즉 그의 장례식이 필요한 것인지를 물어 봤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의논을 받고 있는지 참으로 당혹스러웠다.
그의 유언도 없었고,
그의 유산을 청구하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아파트에 있던 그의 소유물들과
그가 남긴 은행통장은 국가에 귀속되었고 우리는 그 증인 역할을 한
셈이 되었다.
우리는 점점 그의 사후
처리에 연루되어 갔으므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자고 했고 결국 화장으로 결론이
났다.
마침내 공원묘지에
달린 화장장의 영안실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장에 들어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도, 그야말로 아무도
없었다. 아니 딱 한사람 있었다. 장례식을 주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부에서
보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다. 그 목사님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도 설마 하면서
누군가 나타나 주기를 또 기다렸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텅빈 건물 안에서 우리
두 부부를 맨 앞자리에 앉혀 놓고 목사님의 짧은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린드씨의 관은 커튼 뒤로 사라져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몇 번 스쳐 본 그가
어째서 내 발목을 잡는가, 아마 그가 우리 이민자들 중의 하나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알지 못했지만 눈물이 났다. 그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이국 땅에서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린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가족이란 늘
곁에 있다가도 언젠가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간다. 여행하기 위해 혼자가
되고, 공부하기 위해서도 혼자가 된다. 살기 위해서 혼자이어야 할 때도
있고, 혼자이기 위해서 혼자일 때도 있다.
그런데 혼자라는 것이
그 단어만큼 홀가분하지도 자유롭지 않을 때도 있다.
바로 그런 상황이 가슴을
미어지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한다.
린드씨의 갑작스런
죽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이 나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은 여기가 남의 나라 땅 이어서인가. 그래서 더욱 무연고자의 죽음이
쓸쓸해서 울었고 남의 나라 땅으로 이주해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허공에 떠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울었고 그들 모두의 서글픔을 슬퍼하고
있는 나 자신이 한갓 인간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또 울었다.
곁에서 내가 다 울기를
기다려 주고 있는 마이클 처사에게 물었다. “저 사람 재는 누가 가져
가냐”고.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무실로 가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가져 갈 사람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도무지 그냥은 떠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가져가자고 했다. 그가 살던 건물의 꽃밭에 뿌려 주면
좋겠지만 그 건물은 공사에 들어갈 판국이 되었으니 일단은 우리 농장으로
모셔 가서 핀란드의 가족을 찾아보자고 했다.
그런데 마이클 처사가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다. 린드씨가 살던 건물에 마이클 처사의 친척
할머니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린드씨가
자주 들러서 말동무를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웃인 그 할머니가
린드씨에겐 유일한 친구였을테니 할머니가 잠드신 곳에 합장해 넣어
드린다면 린드씨가 옛친구를 만나서 좋아하실거라 했다.
그 할머니는 유언에
따라서 먼저 가신 할아버지 묘에 합장을 해 드렸다. 그런데 거기에 또
린드씨를 합장한다면 아마 할아버지의 영혼이 놀라셔서 “너는 웬 놈이냐”하고
할머님 영혼에게 따지실게 아닌가, 그러므로 조용히 계시는 두 영혼까지
시끄럽게 하는 일이니 그것은 안될 일이라고 했다.
“아! 그렇구나”하고
동의해 준 마이클 처사의 도움으로 아직 손바닥에 따뜻이 느껴지는 그의
유골함을 안고 농장 집으로 돌아왔다.얼마후, 핀란드의 호주 대사관에서
그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다는 통고가 왔다. 우리집 참선방에서 생전에
입고 있던 털조끼 한 장을 달랑 덮고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유골함을
더 이상은 방치해 둘 수가 없었다.어느 화창한 날, 중국에서 온 손님들이
농장에 머무르고 있던 날, 시드니의 기후스님이 신도님들과 함께 찾아오셨다.
기후스님께는 출발전에 미리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자문도 구하였다.

그래서 농장안 숲속,
그의 고향 핀란드를 연상시킬 소나무 한 그루 앞에 자리를 정해서 햇볕
드는 방향에 그 유골함을 모셨다. 다른 볼일로 오신 신도님들과 손님들께는
무연고자를 위하여 한시간씩만 시간을 보시하시라고 여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후스님 덕에 복 지으러 오신 그 분들과 함께 천도재를 지내드리고,
그는 마침내 거기에 잠들게 되었다.영가시여, 부디 좋은 곳으로 가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