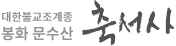잃어버린 새해 첫날에 대한 단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8-02-22 16:59 조회5,511회 댓글0건본문
잃어버린 새해 첫날에 대한 단상
박부영 (불교신문 편집국 부장)
나이가 들어 무감각해진 일 중의 하나가 명절이다. 여인네들이 청포에 머리를 감았는지는 기억에 없지만 단오날 동네 어귀에 큰 그네를 매어놓고 타던 형 누나들의 모습은 지금도 선하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군대 가기 전의 동네 청년들은 단오 며칠 전부터 굵은 새끼줄을 몇 겹으로 꼬았다. 어린 손으로는 도저히 쥘 수 없을 정도로 굵고 긴 새끼줄을 동네 청년들 수십 명이 매고 나무로 운반하는 광경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눕지 않으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득히 높은 그 곳을 날쌘 청년 몇 명이 올라가서 불로 태우기 전에는 도저히 끊어질 수 없도록 단단히 붙들어 맸다. 굵은 나무 판자를 바닥에 깐 발판은 얼마나 넓었던지 장정 3명이 함께 서도 좁지 않았다. 그네에 올라 발을 구르면 신작로가 저 아래 아득하고 들판 너머 마을이 눈 앞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며 침을 튀며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 굵은 그네 줄을 잡을 수가 없어 결국 한 차례도 타지 못한 점이 지금까지 두고 두고 아쉽다. 우리 같은 꼬마들이 타다가 다칠까 나무 가지 위에 걸쳐놓은 줄을 내리려 친구들과 몇 번이나 주위를 맴돌다 발길을 돌리던 그 나무가 지금도 동네 어귀를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다.
부처님 오신 날은 설날과 함께 최고의 명절이었다. 할머니는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절에 갔다 온 뒤 손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다시 절에 가서는 하루 종일 지냈다. 어머니 역시 설거지를 끝내고 절에서 음식을 만들고 허드렛일을 도왔다. 20여 명이 들어갈 정도의 법당에 살림집 두어 채가 전부인 작은 절은 오후가 되면 인근의 전 주민이 모여들어 그야 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초파일 절에 가는 것은 꼬마들에게도 가장 신나는 일이었다. 아직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이었지만 학교 수업은 파장이나 마찬가지였다. 들뜨기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다. 수업이 끝나자 마자, 평소 같으면 남의 논이랑 밭을 휘저으며 온갖 죄는 다 저지르며 반나절은 족히 걸려 도착하던 집을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려 책가방을 획 집어 던지고는 절에 있을 할머니를 찾아 나선 것은 오직 할머니 치마춤에 있을 사탕과 과자들을 동생보다 먼저 먹기 위해서였다. 이듬해 가을에 가장 품질 좋은 종자를 골라 따로 보관해 두었던 쌀을 찾고 한 번도 입지 않던 옷을 손질하는 것을 보며 부처님오신날이 며칠 남지 않았음을 눈치 챈 아이들은 그 날부터 몇 밤이 지났는지 손 꼽는 재미로 살았었다.
무료하던 여름방학을 신나게 보낼 수 있었던 백중도 여름이면 기다려지던 명절이었고 푸짐한 먹을거리와 새 옷 새 신발이 생기던 추석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 중에서도 1년 중 가장 즐겁고 그 여운이 오래가는 명절이 설이었다. 가장 즐거운 일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하지 않아도, 짐승들 꼴 뜯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이 즐거운 이유도 푸짐한 먹을거리와 함께 할머니가 일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골 아이들은 새벽에 일어나 이슬 맺힌 보리밭을 헤저으며 풀을 베어 돼지우리에 던져 준 뒤 밥을 먹고 학교를 갔다. 여름에는 뒷산에 가서 소 풀을 먹인 뒤 학교에 갈 수 있었다. 겨울에는 숙제보다 지게를 매고 나무부터 해야 했고 여름에는 소를 끌고 산으로 가야했다. 일이 더 많은 아이들은 부모를 도와 논 밭일도 했다. 공부는 그 나머지 시간에 하는 오직 자신만의 고독한 숙제지만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성적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은 일이고 학교 공부는 공부였다. 그 지겹던 일을 ‘합법적’으로 쉴 수 있다니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 때 그 희열이 지금도 뚜렷이 새겨져 있다. 설에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월 초하루 일하면 내내 일만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농사에 매달려야만 했던 농부들의 고단한 삶이 묻어있는 풍습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날 아침부터 산에 나무 하러 간다며 할머니 속을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다. 아마 할머니 골탕 먹인다고 청개구리 심보를 부렸을 것이다.
일어나면 옷을 갈아입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에게 세배를 올린 뒤 가까운 친척집을 돌았다.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갔다온 뒤 오후부터는 다른 마을 어른들을 찾아 뵙는다. 세배 순서가 그랬다. 흙에 쌓여 지내다 보니 늘 산발에다 지저분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이 날 만은 옛 선비들이 입던 하얀 도포에 하이칼라로 빗어 넘긴 멋쟁이에다 밝은 얼굴로 다녔다. 돌이켜 보면 새해 첫날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던 것 같다.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못살았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즐겨야할 날을 즐기고 기뻐할 줄 알았다. 그래서 설에는 손에서 낫이랑 괭이를 놓고 일을 쉬었으며 깨끗한 옷과 몸가짐으로 서로를 대접했다. 적어도 1년 중 하루는 그렇게 살 줄 아는 여유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손꼽아 기다리고 웃으며 반기던 명절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새해는 단지 달력속의 기념일일 뿐이다. 손꼽아 기다려야 할 기대가 없다. 옷은 필요하면 언제든 손쉽게 살 수 있고 차례 음식은 살찔까 걱정돼 많지 먹지도 못한다. 아이들도 더 이상 새해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다.
왜 무엇이 새해도 즐기지 못할 정도로 인생을 이처럼 무덤덤하게 만들었을까. ‘너희들은 뭐가 그리 즐겁냐’고 묻던 할머니의 물음을 어느 날 아이들에게 던지는 나를 발견하고 무척 놀랐었다. 작은 일에 즐거워 할 줄 알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기뻐할 줄 알았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소중한 한 가지를 놓쳤다. 아마 설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던 순간부터 그랬을 것이다.
설을 제대로 기리고 즐기는 곳은 이 땅에서 사찰과 스님들 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 정월 초하루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도반 스님들에 이르기 까지 세배를 하고 한해를 축원하는 통알(通謁)은 세간에서 잃어버린 옛 설 풍습을 일깨워준다. 이는 옛 마음을 잃지 않고 잘 간직하며 기려온 스님들의 노력 덕분일 것이다. 반면 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많은 소중한 가치를 버리거나 묻었다. 그 결과 잠시 쉬어가며 웃던 명절 마저도 잃어 버렸다.
추억을 뺏은 것 같아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 늘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못했던, 스님들 통알 모습이라도 언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미안함을 대신해야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