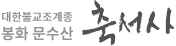수행과 시인의 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축서사 작성일08-08-09 17:54 조회5,078회 댓글0건본문
수행과 시인의 눈
김종환_자유기고가
자원 고갈의 시대에 성큼 들어섰는가. 유가와 곡물가가 치솟아, 지구촌 곳곳에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인간 뿐만 아니라 지구촌 다른 생물들, 특히 야생동물들의 삶도 덩달아 많이 열악해진 것 같다. 먹이를 찾아 목숨을 걸고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들의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
올망졸망한 새끼들을 데리고 과수원에 나타난 산돼지는 먹이를 뒤지느라 과수나무를 뿌리째 망쳐놓는다. 뿐만이 아니었다. 호두나무와 잣나무의 열매를 싹쓸이하는 청설모. 야밤중 가을들판에 떼를 지어 몰려와 탐스럽게 여문 벼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고라니. 수심 가득한 농부의 얼굴에 가뜩이나 깊은 주름이 더욱 깊게 파인다.
참다못한 농부들은 마침내 엽총을 든다. 총성이 울리자, 덩치 큰 산돼지는 검붉은 피를 흘리며 씩씩거리다가 기어이 부들부들 쓰러지고 만다.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펄펄 날 듯 경쾌하게 옮겨 다니던 청설모는 총을 맞자 나뭇가지를 잡고 축 늘어지는 것도 잠시, 이내 하릴없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만다. 운 없게도 뒷다리에 총을 맞고 주저앉은 고라니,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동료들을 뒤좇아 가기 위해 앞다리로 사력을 다해 버둥거려 보지만 부질없다. 처절하게 울부짖는 고라니의 검은 눈엔 절망만 가득했다.
다른 생명을 죽여 자신의 먹이로 삼는 일이나 자신의 먹이를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여 없애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전제조건이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전제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식물 또한 산 것이니까. 이러니 산다는 게 슬픔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찍이 어린 싯다르타는 경운제(耕耘祭)에 참관했을 때, 쟁기 끝에 묻혀 나온 벌레를 어디선가 날아온 한 마리의 새가 쪼아 먹는 것을 보고 대번에 삶의 이런 잔혹한 전제조건을 간파하고 만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바세계 중생들의 살림살이는 어째서 이 모양인가?
이천오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사태는 오히려 더 절박해진 것 같다. 인구문제, 에너지문제, 식량문제, 환경문제 등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상황이 절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기 쉽고 나 이외의 다른 존재의 삶을 배려할 여유를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예리한 시인의 눈은 이러한 정황을 놓치지 않는다.
장독을 치우고, 장독 밑에 깐 판때기를
들어냈다.
한줌의 부드러운 흙이 은밀하게
쥐며느리를 감싸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아니 문이 닫히자
쥐며느리들은 한결같이 둥글게
몸을 말고 있다.
몸속에 다리를
넣고 있다.
상처를 견디기 위해
악착같이 몸을 구부리고 있다.
어디로 가란 말이냐, 쥐며느리들은
꼼짝하지 않는다.
(이윤학 시인의 ‘쥐며느리’ 全文)
거체전진(擧體全眞)! 하찮은 벌레 한 마리 또는 이름 없는 풀꽃 한 송이도 그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 이 국토를 불국토로 장엄하고 있지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찌든 미혹한 우리 범부들의 눈엔 이 국토가 그저 대립과 차별이 가득한 사바세계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사바세계에서의 삶은 언제나 슬픔 가득한 눈물의 골짜기를 헤매는 것일 수밖에 없다.
수행이란 결국 삶의 슬픔을 승화시켜 이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그것은 안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우리들 마음이 모두 본질적으로 맑고 깨끗하다는 사실을 자각해가는 길이며 밖으로는 뭇 생명 있는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립적인 차별을 보지 않고 일심동체가 되도록 노력해가는 길이다. 그것은 또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며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고 한 유마의 길과 다름이 아니다.
유마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불쌍하다고 살려서도 안 되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죽이는 걸 용인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죽어가는 야생동물이 불쌍하다고 느끼는 그놈, 우리의 먹이를 지켜내기 위해 악역을 맡은 농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는 그놈, 도대체 그놈은 무엇인가? 만약 조금이라도 생각을 굴려 답을 구하려 든다면,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그림 속의 달마가 뛰쳐나와 우리들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코를 잡아 비틀 것이다. 자아,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로 덧붙이자면, 말 잘하는 사람이 지천인 시대이고 코흘리개 어린애도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에 올리는 세상이다. 바야흐로 말과 주장이 사태가 난 시대이다. 어디 백가쟁명의 시대인들 이에 견주어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모든 상대적인 것들을 여의는 불이(不二)의 도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침묵이라는 사실을 유마거사가 몸소 보여주지 않았던가. 거기엔 실로 문자도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도 또한 없다. 만약 답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입도 뻥긋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함이 없이 그 얻은 답을 드러내 보일 것인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