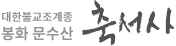그대, 수청수(水淸洙)를 아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축서사 작성일10-06-06 11:34 조회4,732회 댓글0건본문
그대, 수청주(水淸珠)를 아는가?
김윤희_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 발행인
20년의 세월이 가까워 오나보다. 사남매가 둥글게 앉아 따끈하게 데워진 여름 옥상에서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밤이 이슥하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던 때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언론사에 첫발을 내딛은 내게는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던 남동생이 있었고, 군대생활에 말뚝을 박겠다는 막내 동생이 하나 더 있었다. 그리고 시쳇말로 제 때 결혼을 해 아들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있는 언니가 있어 부모님들께는 소박한 자랑이 될 법한 자식들이었다.
그 시대는 아마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국가적 이슈도 큼지막하게 당도하던 시절로 기억된다. 북한의 주석 김일성이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가 그 시절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지금처럼의 인터넷 문화가 급속도로 보급되기 이전의 시대 상황이었으므로 뉴스는 그야말로 TV를 통해 보고 듣거나, 라디오를 통해 듣는 뉴스, 신문을 통해 활자로 접하던 뉴스가 전부이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언론 매체의 힘은 가히 최고의 획을 긋던 서슬퍼런 시절의 마지막 시대를 살던 때였다.
그럼에도 난 언론에 몸을 담고 있는 스스로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며 살고 있었고, 왠지 사회성 기사를 쓰는 일은 나의 생리와는 너무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문화부를 자처해 문화 기사를 써댔고 좋다는 산과 들을 찾아 헤매고 다녔으며 세상을 바꿀만한 서적들을 찾아 서점을 서성이곤 했다. 돌이켜 봐도 그 시절을 살아가는 데 그 만한 명약은 없었다.
그런 나조차도 알지 못하던 정서가 깊숙이 자리했던 때문이었을까. 누군가 굳이 사회의 폐부를 들추지 않아도 세상은 절로 돌아갈 텐데 하는 생각과 애써 의식적이지 않아도 의식의 기반만 확고하다면 그 어떤 외부의 작용에도 끄덕하지 않을 힘은 저절로 발휘된다는 사실에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고 있던 때였다.
그러니 험한 세상이라 일컫는 타인들의 이야기와 우려는 내 앞에서는 그다지 큰 장애가 되질 않았다. 있으면 주고, 없으면 다시 다음을 기약하며 물이 흐르고 인연이 화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청춘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형제들은 늘 욕심을 좀 가지며 살라 했고, 부모님조차 좀 제 것을 챙기라는 주문을 하곤 했다. 그러나 나의 근성은 조금도 바뀔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물건을 구입하는 일에서도, 누군가 내게 어떤 형태로든 손을 내미는 상황에서도 나는 언제나 이유를 묻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굳이 복잡해지지 않고 싶은 이유에서도 그랬으며 그런 이유가 다시 어떤 말을 만든다는 사실에 나는 그저 간결한 쪽이 좋기만 했으므로 불을 보듯 훤한 상대의 기만에도 난 제동을 걸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 심판을 봐 주리라. 분명, 누군가는 옳은 쪽을 짚어주고 있으리라는 부동의 믿음이 명확히 자리 잡고 있었던 까닭이다.
불교를 만난 것은 내 본래 면목을 스스로가 알아챈 일대 전환점이었다. 그 즈음, 내게는 수청주(水淸珠)가 하나 주어졌다. 그 보석은 품 안에 있지 않아도 좋아 그저 생각만으로도 흐뭇해지는 ‘도반’이었다. 나를 선배라 부르던 후배는 비록 나이는 나 보다 아래였지만 불교에 먼저 귀의한 것이 나 보다 먼저였고 불교가 한 없이 좋은 교계의 기자였다.
후배는 직업적인 불교관이 아니라, 불자로서의 불교관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진짜배기였다. 그리하여 불교청년회라는 곳에 첫발을 내딛고 청년 불자, 혹은 불자로서의 종자를 심기 시작한 것도 실은 후배의 권유에 의해서였으며 불교의 사상 안에는 기가 막힌 설득력이 있어 내 이전의 삶이 그릇된 형태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가르쳐 준 것도 후배가 이끌어준 불교를 만나고 부터였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 굳이 법회라는 성격을 빌리지 않더라도 법당의 부처님 앞에 앉아 나를 고하고, 내 안의 나를 만나는 시간은 내가 꿈꾸던 소유하지 않아도 좋았던 그 삶을 날마다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는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삶이 결코 망상이 아니라고 입증해 주고도 있었다.
나는 거의 시간이 날 때마다 후배와 마음을 나눴고, 그런 다음의 문제들은 편지라는 이름으로 후배와 나를 오가며 법거량을 하듯 이어주고 있었다. 그것이 불교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숨길 수 없는 ‘주머니의 못’이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알게 된 그 주머니 속 못은 결국 ‘공부’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공부’쪽을 서성이던 생각이 가닥을 잡기 시작하자 우리들에게는 목표가 설정 되었고, 목적이 분명한 길을 걷는 ‘도반’이라는 정말 좋은 이름이 붙여졌다. 서로가 만난 선지식에 대한 이야기와 그 선지식의 수행이야기를 기사화하며 혹은 우리들의 공부에 빗대어 더 큰 가르침으로 대입시키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때 얻은 공부꺼리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 가장 큰 길잡이가 돼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20년이 흐른 지난해 가을, 우리 사남매는 제주도에서 얼굴을 맞대고 앉아 올레길을 옆에 두고 밤을 지새웠다. 영민하기만 했던 나의 아우는 지금 공직자로서 자로 잰 듯 빈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군인으로 남기를 소원했던 막내 동생은 역시 최고의 군인으로서 멋진 지휘관이 되어 생활하고 있고, 언니는 현모와 양처의 길이 최고의 길이라며 전업주부로서의 고운 일상을 꾸려가고 있다.
그런 언니와 남동생들이 그날 내게 했던 말은 가장 귀한 보석을 한아름 안겨준 일이 되었다.
“나는 작은 누나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작은 누나가 발견한 불빛을 의지해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20년 전 욕심을 갖고 살라고 말하던 내가 부끄럽지.”
“누나, 우리 몫까지 다 누나의 수행으로 대신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게 믿고 살게. 아직 불교와 가깝게 살지는 못해 많이 쑥스럽지만 고마워 누나~”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이제야 알게 됐다. 나 스스로를 믿는 당당한 힘이 생기더라. 불교대학을 다니며 내 안에 자리 잡는 어떤 기운을 알게 됐다. 다 내 동생 윤희 덕분이지. 어릴 적, 그 말괄량이 동생은 어디 가고, 지금은 나 보다 몇 생을 먼저 살다 다시 온 스승처럼 늘 앞서서 길을 알려주는 윤희를 난 늘 자랑으로 여기며 살잖냐.”
모처럼 사남매가 함께 한 시간은 결국 나의 이야기와 불교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영가의 이름으로, 혹은 어떤 한 점의 불성이 똑 하고 떨어져 나를 만들고, 우리로 만나졌을까를 골똘히 생각한다. 그러면 그 안에 소소한 웃음 웃으며 공(空)으로 떨어진 나의 후배 진짜 공실(空實)이 있고, 무릎을 탁 치고 마주앉는 도반 삼세화(三世華)가 있다.
가까스로 무명에서 눈이 떠지던 때 알았던 수청주(水淸珠)라는 말. 후배의 진짜 이름은 그렇듯 주변을 맑히고 세상을 맑히는 귀한 구슬, 수청주였음을 오늘에야 밝힌다.
나 또한 진정 나를 맑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그 보배로운 구슬, 수청주를 내 안에 옮겨놓고자 다함이 없는 길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당하게 걸어 나가려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