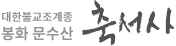복전이란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7-11-21 15:55 조회3,147회 댓글0건본문
복전이란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이다
정찬주 (소설가)
남도산중 사자산 쌍봉사 위 산자락에 산방을 짓고 산 지 7년째 되었다. 산중에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나와 인연을 맺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다 복전(福田)이라는 점이다. 삼천대천세계가 다 복의 씨앗을 심고 복의 열매를 거두는 ‘복밭’이다.
나는 글을 밥 삼아 일 삼아 쓰는 이른바 전업 작가이다. 그러니 내게 가장 큰 복전은 내가 집필하여 내놓은 작품들이다. 시공의 인연과 테두리를 좁혀서 자기가 하는 일을 두고 복전이라고 인식하고 깨닫는 것도 나름대로의 견성(見性)이라고 생각한다. 견성이란 글자 그대로 자신의 성품을 보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30여 년 동안 오직 불교작품만을 고집해서 집필해 온 까닭은 쌍봉사와의 인연 때문이다. 대학을 다니던 70년대 초 나는 반정부시위 등으로 강의가 길게 휴강이 되거나 방학이 되면 서울에서 아주 먼 쌍봉사를 찾았다. 당시 쌍봉사는 기차역에서 30리 길을 걸어야 했고, 몹시 퇴락한 절로 대중이라고는 주지스님 한 분과 공양주보살 한 분이 전부였다.
주지스님이 출타하고 나면 절은 더욱 쓸쓸해졌다. 나는 무슨 의무감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심히 낙엽을 쓸기도 하고 법당에 들어가 청소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른 걸레를 들고 불단을 청소하다가 부처님 손바닥과 어깨에 켜켜이 쌓인 먼지도 닦게 되었는데, 그때 공양미 삼백 석에 심 봉사가 눈 뜨듯 부처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내 눈에 낀 헛것이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미소 짓고 계셨다. 어느 작가가 석굴암 부처님의 미소를 보고 찬탄한 그런 미소가 아니었다. 내가 내 눈으로 본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소였다.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나는 고압선에 감전된 듯했고, 내 몸의 분자 구조가 바뀌는 듯했다.
‘그렇다. 불교의 궁극은 바로 저런 미소에 있다. 어떤 시비나 인과에도 휘둘리지 않고 저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 아닐까. 나도 부처님을 닮고 싶다.’
나는 한 순간에 부처님의 제자가 돼버렸다. 불자가 되는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정해졌다. 나는 쌍봉사를 떠나면서 주지스님과 약속했다. 사라진 가람들을 옛 모습으로 복원할 때 나도 반드시 일조를 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서 그 주지스님은 내게 임종게를 보낸 준 뒤 금생의 인연을 끝냈다.
我今終生死 나 이제 생사를 마치려 하네
誰得誰失道 도는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는데
過去無來處 과거는 온데 간데 없고
海光自靑靑 바다 빛만 절로 푸르디푸르오
나는 그 주지스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때의 약속만은 늘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말빚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 스님이 내게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마련해준 복전이라고 생각한다. 쌍봉사 경내에 있는 새로운 안내문이나 종각 안에 걸린 편액의 산문은 내가 지은 글들이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글을 읽고 발심이 되고 신심이 솟구치기를 기원하며 쓴 글들이다. 전각을 한 채 한 채 불사할 때 모연문도 내가 대부분 썼다.
최근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조주스님이 머물렀던 백림선사를 찾아가서 스님의 자료를 가져왔다. 현 주지스님이 쌍봉사 창건주 철감선사와 조주스님의 진영을 그려 모시고자 하기 때문이었다. 철감선사와 조주스님은 남전스님의 회상에서 공부한 사형 사제 간으로 특히 차(茶)를 매개로 한 깊은 인연이 있는 선승들인 것이다. 평상심이 도(道)라는 가풍을 내세웠던 남전스님도 철감선사에게 ‘우리 종(宗)이 너로 하여금 몽땅 동국으로 흘러가는구나’ 하고 인가했다.
나는 그동안 성철스님의 일대기인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중국 구화산의 지장스님의 일대기인 <다불(茶佛)>, 혜초스님의 행로를 따라간 산문집 <돈황 가는 길>, 전국의 암자를 순례한 <암자로 가는 길> 등등 불교를 소재로 한 글쓰기에만 반평생을 보낸 셈이다.
그러나 나는 육조 혜능스님이 행자시절에 방아를 찧던 중국의 오조사와 스님의 등신불이 봉안된 남화선사를 다녀온 바 있지만 스님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 스님의 한 제자가 달마스님이 수많은 절을 짓고 경전을 번역한 양무제에게 아무 공덕이 없다고 했는지 의아해 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짓는 것이다. 복을 공덕이라 하지 말라. 공덕은 법신(진리의 몸)에 있고 복밭에 있지 않느니라. (중략)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덕이니라. 공덕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선(禪)이야말로 공덕을 짓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얘기다. 지금의 나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육조스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내 복전을 일구는 글쓰기보다 참선으로 몸과 마음을 닦아 부처가 되는 것이 참 공덕이라는 말씀인 것이다. 육조스님의 말씀은 언제 떠올려도 내리치는 벼락같다.
멀리서 내려다보니 쌍봉사 극락전 단풍나무도 지심귀명례하고 있다. 뿌리로 돌아가기 위해 붉게 단풍이 들어 있는 것이다. 나 역시 또 가을이 깊어가는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와서는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쓴다. 복전을 두고 일구지 않는 것도 죄 짓는 일이리라. 내 글을 읽고 마음에 계합된 바가 있어 6개월의 시한부 삶을 6년째 연장하신 분도 있고, 대학원 재학 중에 홀연히 출가하여 스님이 되신 분도 있으니 어찌 복전이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에게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산방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당이고 나를 찾는 선방이고 삶의 고마움을 깨닫게 하는 복전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